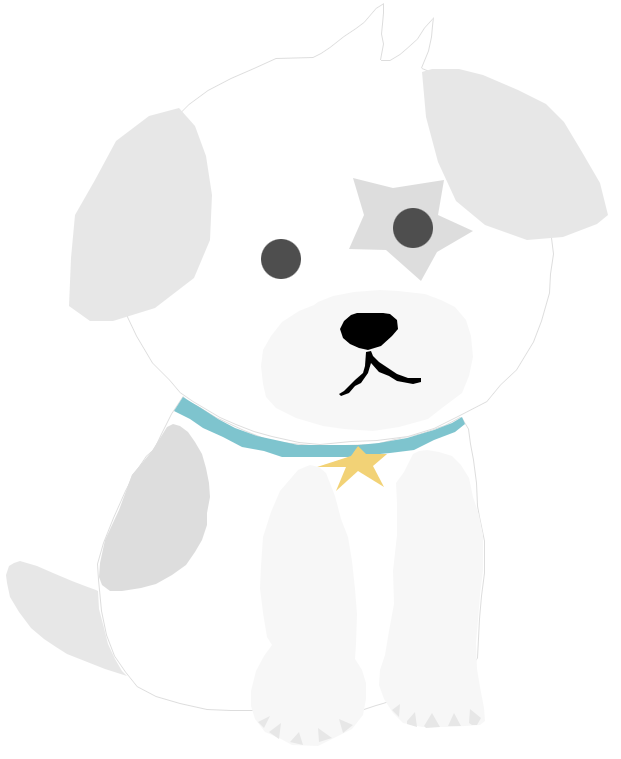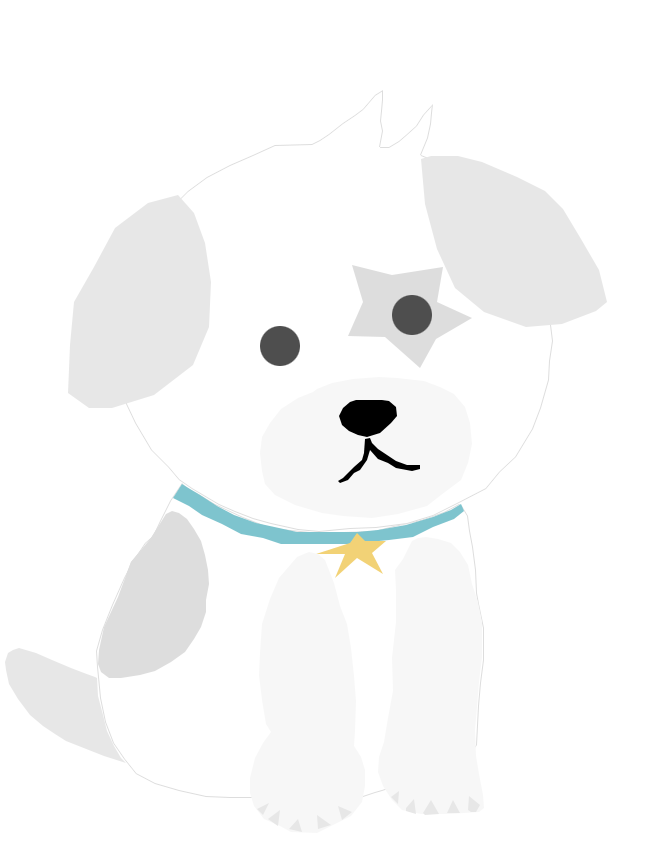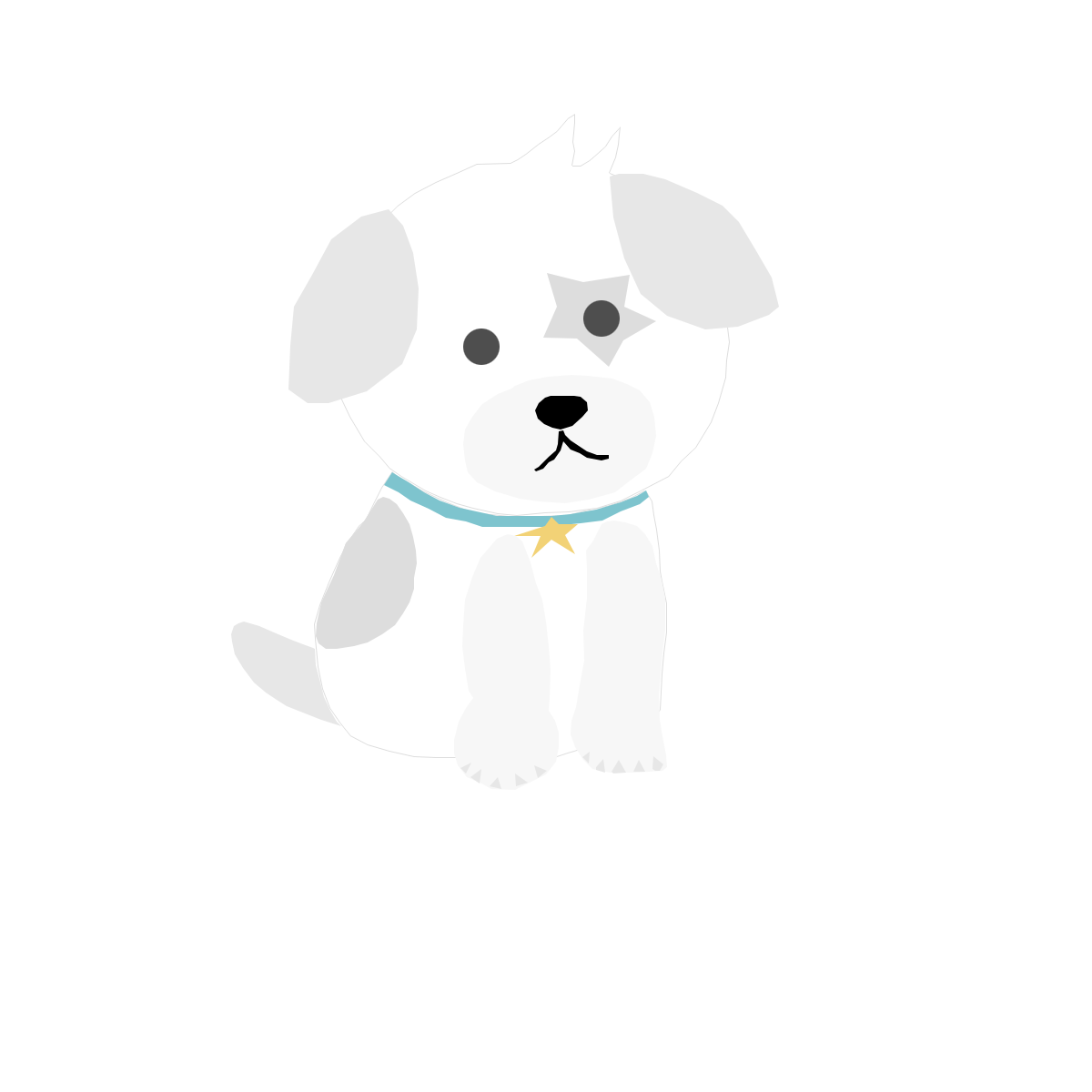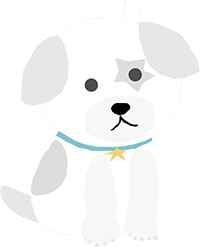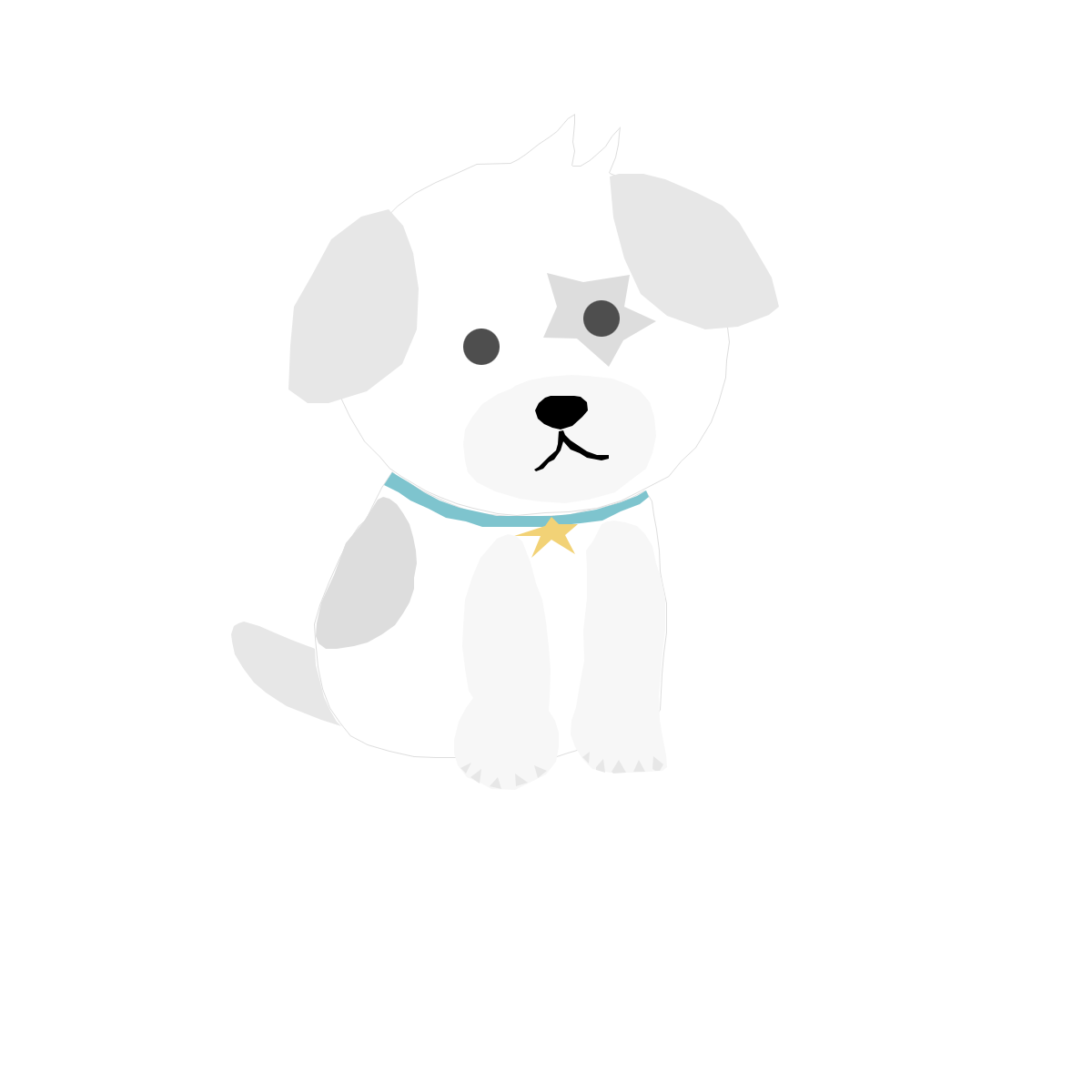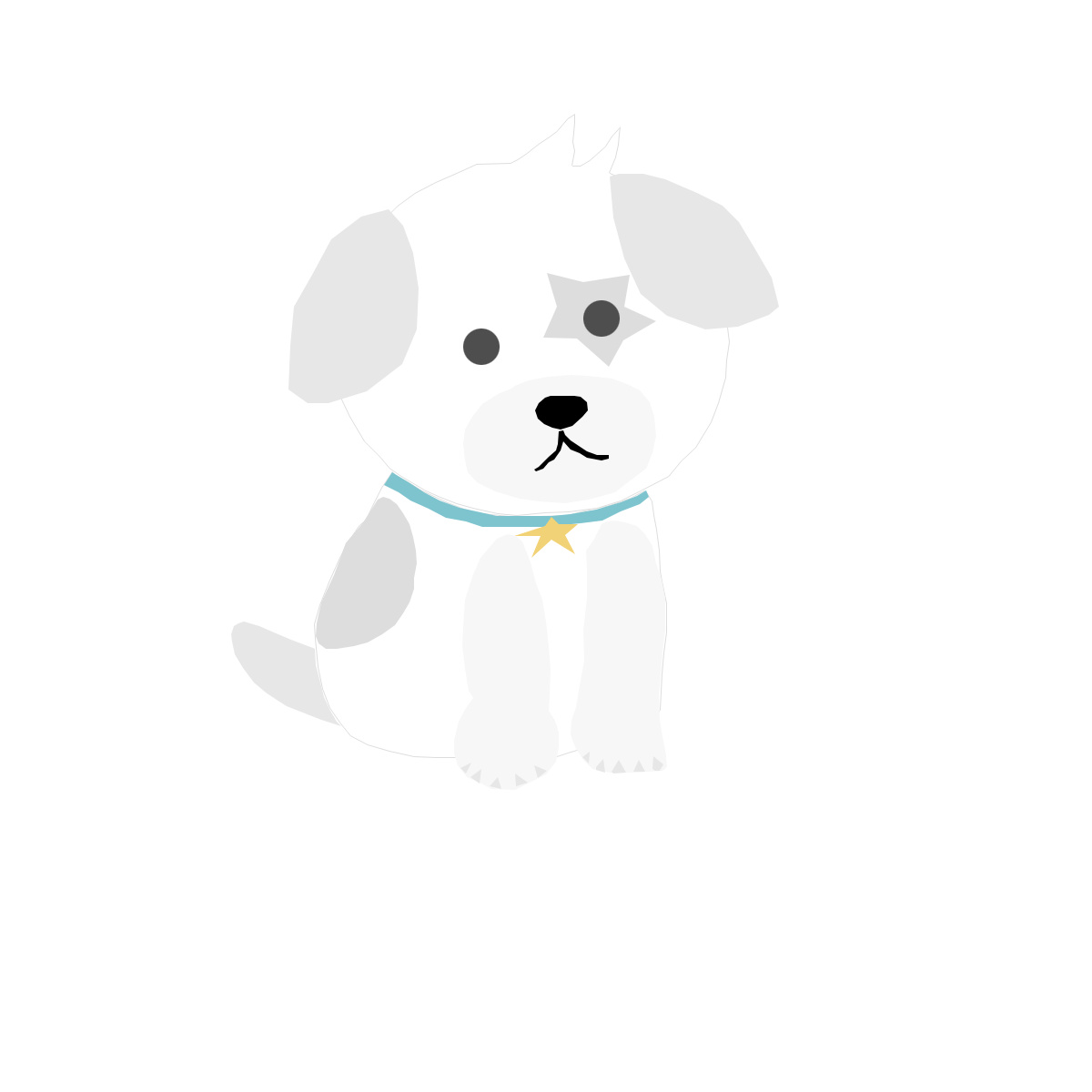佛선 판사가 검사 견제권한…美 '검사장직선제'로 중립성 보장
https://m.sedaily.com/NewsVIew/1VPFHP8BR2#_enlipl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눈 앞까지 왔다. 판사, 검사, 고위급 경찰을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기관. 개인적으로도 너무 권한이 많은 것 같기도 하다. 기소권이야 없으면 허수아비신세니 꼭 주어야한다쳐도, 공수처를 꼭 1개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판사를 물어뜯을 수 있는 기관과 검사를 물어뜯을 수 있는 기관을 분리해도 될텐데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다. 전관 - 현역 간 커넥션 병폐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다. 멀리갈 것도 없이 지금 국회를 보면 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검사 출신은 17명, 판사 출신은 9명이었다. 국회의원 총원이 300명이니, 8.6%나 된다. 특히 검사는 판사출신의 2배나 된다.
이게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이는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국민들의 선택을 직접적으로 받지않는다.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지않고, 법원장도 직접투표로 선출하지않는다. 여론에 이리저리 휩쓸리지말고 중립적인 판결을 하라는 배려를 받는다. 그러나 이런 배려를 받는 판검사들은, 정당공천을 받고 정치판에 뛰어든다. 과연 이 사람들이 참여했던 재판들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려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한댄다. 지금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공수처 발목을 붙잡으려하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02408751
그래도 국회 쪽은 사정이 나은편이다. 정당차원에서 공천 편의를 제공했다해도, 어쨌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하지만 민간으로 나가면 이야기가 심각해진다. 판사, 검사, 경찰, 고위공직자 등이 대형로펌, 대기업에 거액으로 스카우트되거나, 판사나 검사의 경우 변호사 개업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다.
이들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인맥, 친분을 내세워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때문이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하는 정치인들조차 전관출신 변호사를 쓴다. 전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재판 대신 행정부가 내리는 행정심판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기대받는다. 결국 로비스트문제인 셈.
얼마전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 설치 연기를 주장했다. 그냥 어이가 없을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야말로 공수처 설치가 어떻게 강행될 수 있었는 지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 중 한 명이기때문이다. 지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월 1억원(주의 : 연봉아님)이라는 거액의 전관예우에 휘말렸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공수처 발목잡기를 대놓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럼 전관예우를 받지못하게 아예 변호사같은 걸 못하게하면 될 거 아니냐? 실제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위헌소지가 커서 사장되었다. 현실적으로도 먹고는 살아야지... 정치쪽도 마찬가지로, 직업종교인들이 정치와 거리를 두듯 '관례적으로' 불출마할 수는 있어도 전직 판검사들을 아예 법적으로 국회의원선거에 못나오게 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듯 전관들을 규제하는 것이 힘들다보니 현직 판검사들과 고위공무원들을 견제해 연결고리를 끊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하게 된거고 그 수단으로 공수처 설치가 채택된 것이다.
이번 공수처법안은 야당쪽에서 야당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국회의원이 기소대상자에서 빠졌다. 그에따라 국회의원이 불기소특권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할 것을 염려해 고위급 행정부공무원에 대한 기소권도 빠졌다. 여기엔 행정부나 입법부는 일정기간을 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때문에, 공수처 기소권같은 극약처방이 필요없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결국 법원과 검찰에 대한 기소권만 남았다.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전관예우 시비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공수처법안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위해,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은 아예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했었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 대신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검찰인사권을 독립시키려했다. 하지만 실행하지못한 채 임기가 끝났다. 후임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전관예우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이게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판검사 전관예우문제가 지금처럼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치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쏟아지는 불출마 릴레이, IMF관점으로 보는 자유한국당 당권싸움의 결말 (0) | 2019.11.18 |
|---|---|
| 패스트트랙 정국, 여권이 검찰개혁 공수처설치를 역으로 꼬아버린다면 (0) | 2019.10.27 |
| 김포 도시철도 근황 (0) | 2019.10.20 |
| 여의도 촛불집회, 관건은 자유한국당 피선거권 박탈 문제(국회선진화법위반) (0) | 2019.10.17 |
| 검사(검찰)출신들의 국회 입법부 장악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0) | 2019.10.16 |
| 한국당 민부론과 조국 의혹 수사, 떠오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평가설 (0) | 2019.09.23 |
| 남양주 계곡 단속 (0) | 2019.09.17 |
| 이언주 삭발 사건, 황교안-손학규 조국파면 국민연대 회동 (0) | 2019.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