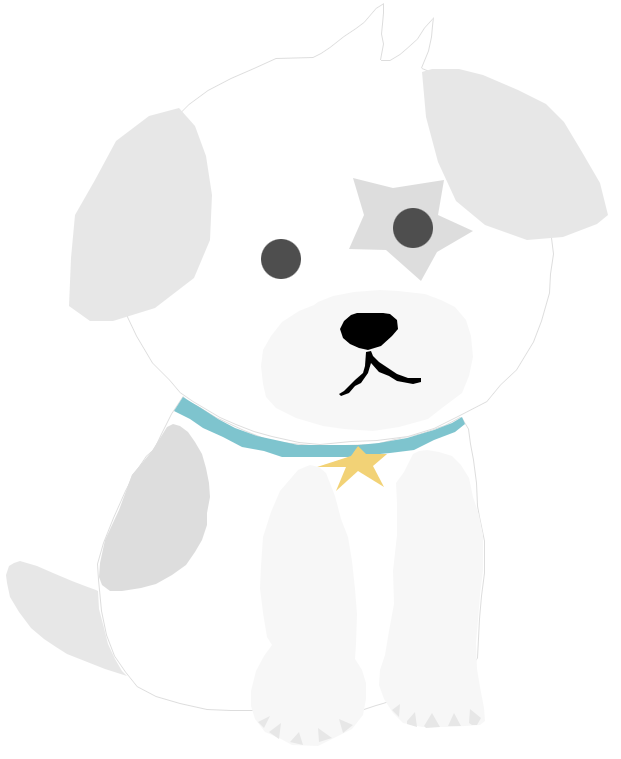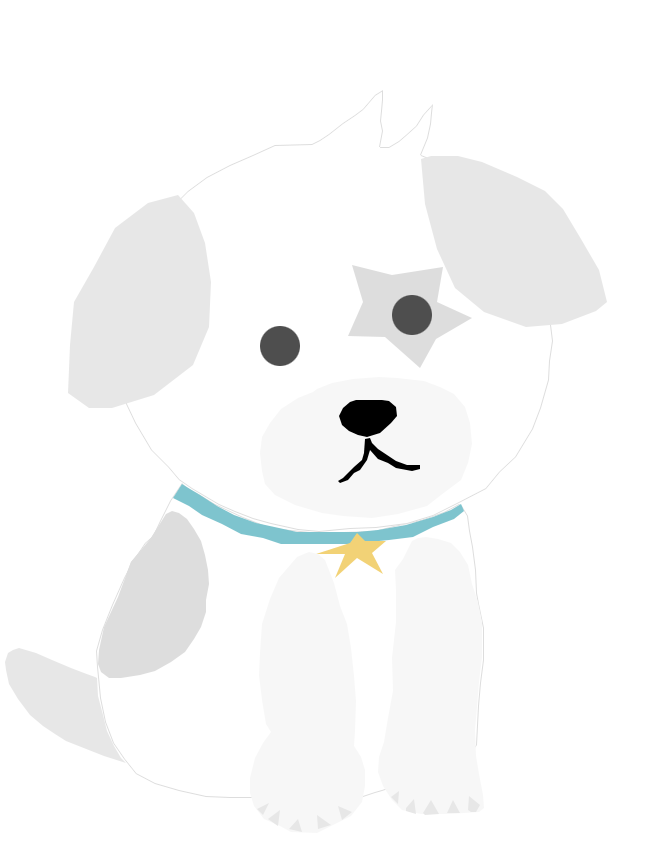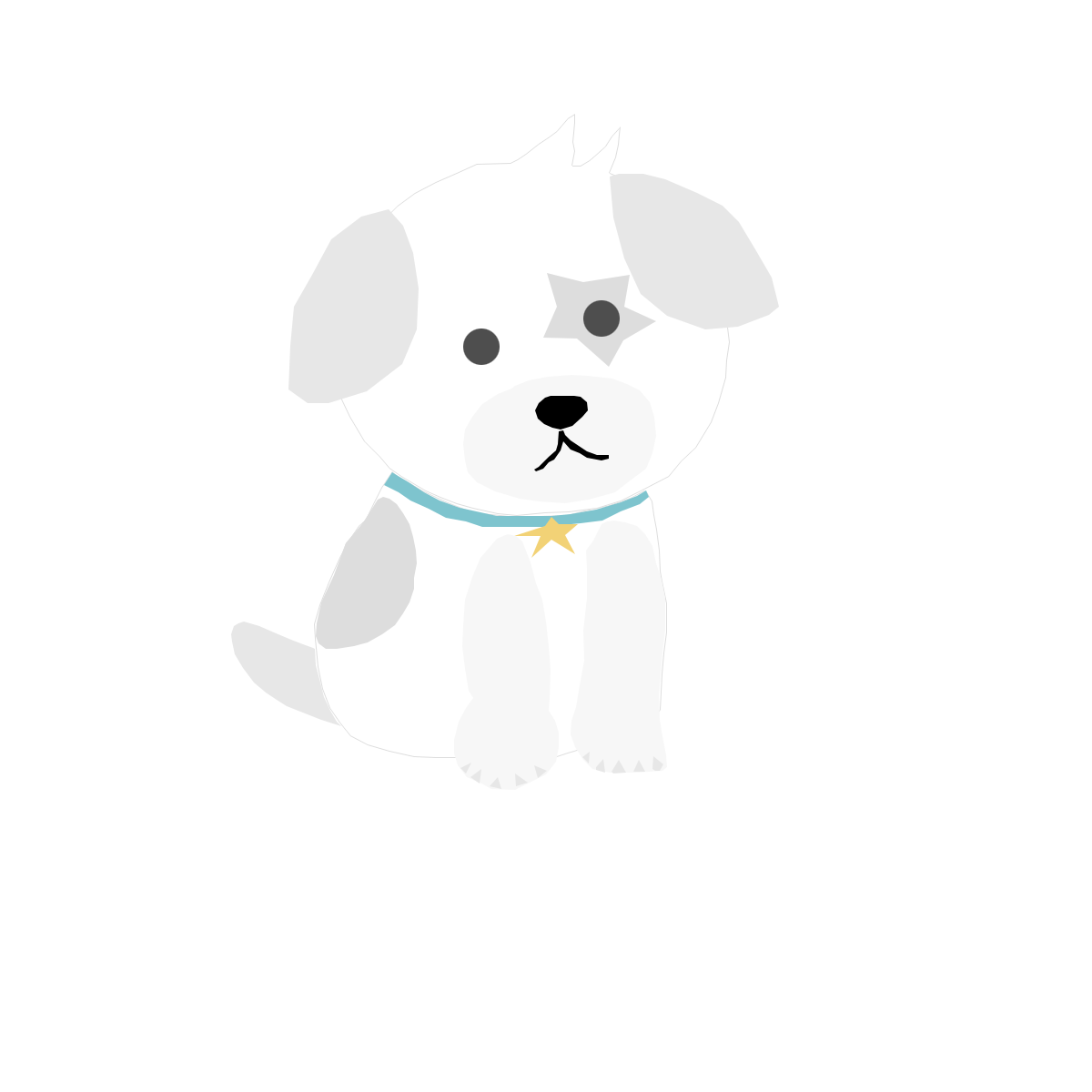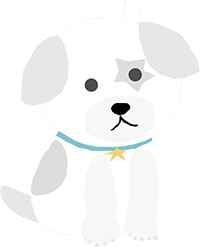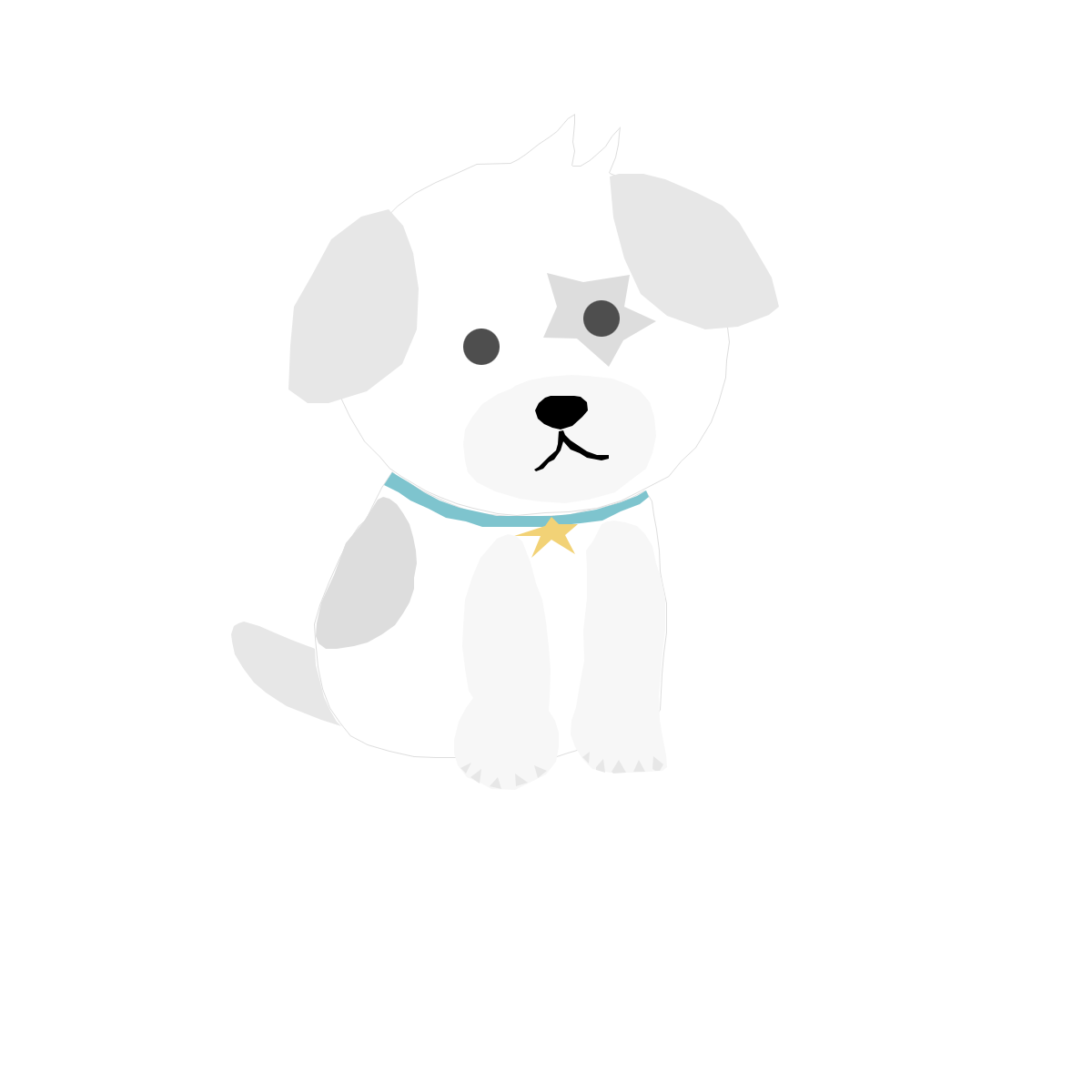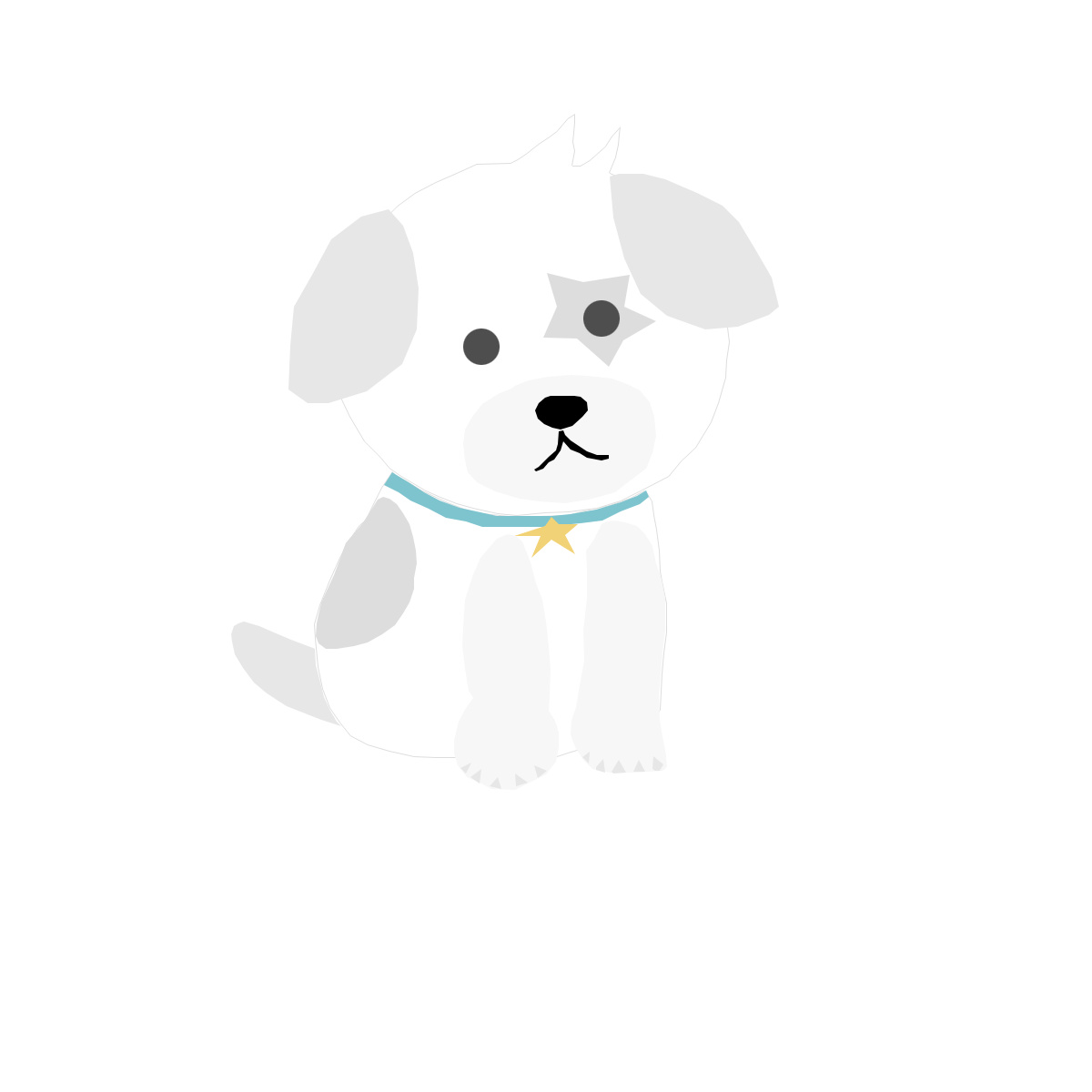위 다큐멘터리는 헬조선현상의 원인을 한국의 각종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헬조선 현상의 도화선이 되고 크게 번지게 만든 장작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헬조선현상이 설명되지 않는다. 사회에 대한 불만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헬조선이라는 말같이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비칭이 전면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과거, 한국인 개개인의 국가관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직되어있었다. 국적변경이나 이민은 고사하고 유학이나 장기체류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적었던 시절이다. 단기 해외여행조차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민, 유학, 워킹홀리데이, 해외인턴쉽같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떠다니고 있으며 관심만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도 쉽게 받을 수 있다. 거기다 원정출산같은 상류층 2세들의 국적문제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결국 국적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갔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자기자신과 국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변해갔다.
과거, 정치라는 것은 높으신 분들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자기자신과 정치영역 간의 관계가 수동적인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시간이 흘러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지금, 정치참여에 필요한 능력적 허들은 낮아졌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정치권력은 국가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공직활동은 몇몇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제외하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공직활동은 공무원이라는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선출직이나 임명직은 더 어렵다. 후보출마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터무니없이 소모되기 때문에 돈이나 시간적여유,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 엄두도 못낸다. 임명직은 보통 정치적 연줄로 이뤄지는데 이것도 돈이나 사회적 지위없이는 힘들다. 시민운동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 시민운동은 언론권력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힘이다. 또한 어버이연합 사건을 기점으로 시민운동은 한국사회에서 가치를 상실했다.
결국 한국에 태어나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불과 몇천만표 중의 1표 뿐이다. 정치인이라는 창구를 통하는 셈이다. 하지만 그 창구가 많지 않고 금전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위주가 아닌 지역단위로 분할되어있고 공약의 신뢰도도 낮은 엉터리 창구인 경우가 많아 개개인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표가 되거나 영향을 끼치더라도 유권자가 당선자에게 표를 던지면서 가졌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실상의 사표가 많이 나온다.
이건 '우리'정치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우리'사회 영역 전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무언가를 좋게바꾸고 개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꿀 힘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세대가 바뀔수록 '우리'라는 수식어는 점차 떨어져나갔다.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주요 단위인 국가를 자기자신과 분리해 생각할 수 있게 변해갔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세대가 경제적으로 무너졌다. 직업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특정세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 중 많은 수는 초-중-고-대 나와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럴 요건을 갖추더라도 기피한다. 청년세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었고 N포세대가 탄생했다. 이것은 얼마나 포기했느냐에 따라 개인차는 있겠지만 크든작든 “표준적인 한국인”으로부터 멀어진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청년세대들에게 표준적인 한국인은 "우리"가 아닌 “그들”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그들의 나라”로 객체화되었다.
물론, "우리나라"를 완전히 객체화시킬 수는 없었다. 현실적으로 이민은 매우 어렵고 타 국가와는 언어적, 문화적 경계가 있으며 차별문제도 있다. 아무런 기반이 없는 다른 사회로 이동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객체화만으로도 기성세대의 국가관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데에는 그정도로도 충분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건 껄끄러웠지만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헬조센이라는 단어를 차용해 의미를 확장시켜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시작된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고 사이버공간을 너머 실생활로 차츰차츰 퍼져나갔다.
'기타 > 안티 내셔널리즘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헬조선의 회사카톡 (0) | 2016.06.10 |
|---|---|
| 이맛헬의 대표적인 예 (0) | 2016.06.04 |
| 헬조선과 로또복권 그리고 당첨금 (0) | 2016.05.17 |
| 헬조선의 구조조정 (0) | 2016.05.14 |
| 케이블에 진출한 수저론 (0) | 2016.05.09 |
| 대학생이 뽑은 자존감 도둑 (0) | 2016.04.30 |
| 한국의 N포세대와 일본의 사토리세대 (0) | 2016.04.22 |
| 한국 기준 무개념 신입사원 (0) | 2016.04.19 |